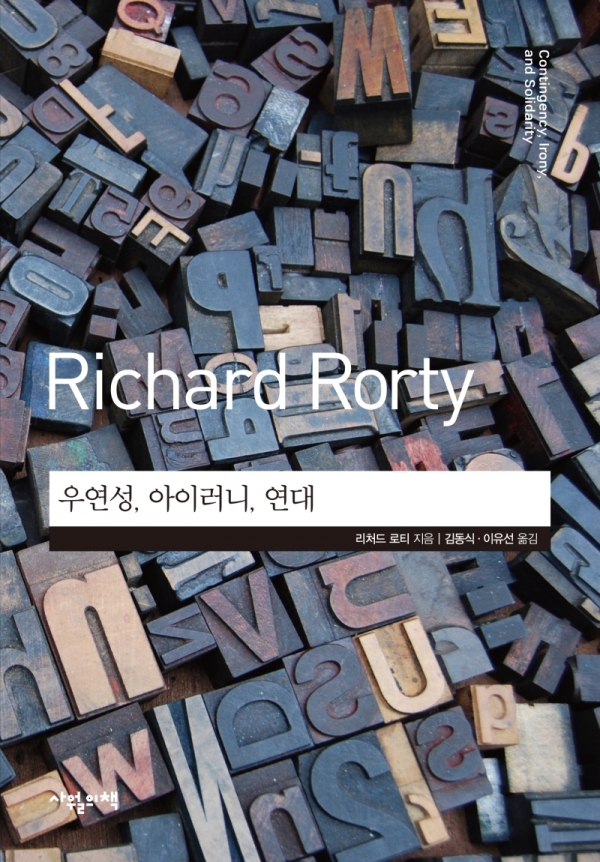11 27
현대철학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교훈은 감정이 자기만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어 바깥에, 이성 바깥에, 의식 바깥에, 언제나 숨어 있지만 결코 점령당하지 않는 감정의 영역이 있다. 신화, 광기, 무의식, 실재계는 언제나 계몽, 이성, 의식, 상징계보다 앞서 존재했고, 수많은 억압과 은폐 시도 속에서도 사실 단 한 번도 그 위세가 꺾였던 적이 없다("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웬 진창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거나 제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꿈쩍하지 않아도(우리 반 ㅇㅇ이처럼) 그걸 이성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데카르트가 아무리 논리정연한 말로 설득하거나 윽박질러도 마음은 자기만의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를테면 내가 며칠 전 5월 18일 오후에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 나는 사실 이상이랄지 신념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가 5.18이나 다른 사회적 참사에 천착하는 것은 오직 나의 엄마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열한 살 때 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크게 변화하고 있었고 나는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어른들은 자기만의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어린애들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었다.(나는 지금은 그들을 이해하고 깊이 연민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은 없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정말로 실패하고 말았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나는 그저 멀뚱한 얼굴로 좀 주눅 든 채 서 있을 뿐,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정상적인' 반응을 전혀 출력하지 못했다. 그런 나를 보고 할머니는 지 에미가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고 했고, 사실 나도 내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안 슬프지?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나?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 죄책감이 이후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정서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은 자기의 길을 간다. 엄마의 얼굴이 흐릿해질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책감은 조금도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방팔방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고 느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광주 5.18, 제주 4.3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엄마가 죽었는데 괜찮았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에도 영원히 괜찮을 수가 없다. 이태원 참사가, 오송 참사가 일어났다.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들이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다. 나는 회초리가 대상을 빗맞히고 있다고 느낀다. 내 차례가 오기를, 그래서 내가 적절한 벌을 받고 마침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린다.
이 마음의 흐름을 밝혀내는 데 15년이 걸렸다. 5월 18일 오후, 어디선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목포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마지막 퍼즐을 끼워맞췄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드디어 찾았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고통과 집착을 설명해줄 서사를 드디어 완성했다! (물론 현대철학에서 이 서사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잠정적인' 것, 오차와 수정을 끝없이 반복하며 '미끄러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쓴 이야기가 슬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정신이 명료하고 평온해짐을 느꼈다. 두렵고 슬픈 것은 혼란이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간다. 내가 15년 동안 죽도록 매달려서 열한 살의 내가 싸이코패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4월 내내 코바늘로 노란 리본을 백 개씩 만든 것이 어떤 선한 의지가 아니라 빗나간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해도, 그것은 이성이 하는 일일 뿐 마음은 아무 관심이 없다. 마음은 아직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외로운 열한 살 아이의 얼굴을 한 채 어른들이 어서 나를 혼낸 다음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이젠 걔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지 않는데(왜냐면 비슷한 말을 한 철학자가 너무 많음),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지우고, 다른 판본으로 다시 쓰고,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정본定本은 없다. 여전히 두렵고 외롭지만 어쨌든 오해는 풀려서 좀 편안해진 마음이, 자기의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걸어간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우뚝 서서 땡깡을 부리기도 할 것이다. 나는 그애를 더이상 막아서거나 돌려세우려고 하지 않고, 대신 옆에서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판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며 그애가 웃기를 기다릴 것이다. 다행히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이런 일에는 전문가라는 뜻이다.